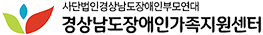장애 극복이라 하지 마라, “열심히 훈련한 선수”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1,971회 작성일 23-11-06 11:24본문
항저우장애인아시안게임 참가 선수들이
경쟁주의·이기주의 사회에 던지는 질문들
[주간경향] “가장 기쁜 날, 가장 슬플 때 이야기를 왜 굳이 하나.”
대한장애인체육회 관계자가 항저우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 앞서 기자에게 한 말이다. 가장 기쁜 날은 메달을 따는 날이다. 가장 슬픈 때 이야기는 장애를 갖게 된 사연이다.
큰 성과를 낸 뒤 인터뷰에서 기자들은 ‘관례적으로’ 과거 스토리를 묻곤 한다. 메달리스트에게 장애를 입은 사연을 질문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했다. 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비장애인과 똑같이 선수로만 봐달라.”

기자는 지난 10월 항저우장애인아시안게임을 취재하면서 많은 걸 느끼고 배웠다. 2000년부터 스포츠를 집중 취재해온 나름 전문기자였지만 ‘정말 무관심했고, 정말 몰랐다’고 반성했다.
장애인 선수를 바라보는 관점
장애인 선수를 바라보는 관점부터 많이 바뀌었다. 장애인 선수는 신체적 장애가 있을 뿐 비장애인 선수와 다를 게 없다. 노력은 고통과 인내를 수반하게 마련이다. 한쪽 손이 없어도 바벨은 들어야 했고, 발이 뒤틀려도 트랙을 달려야 했으며 손발이 떨려도 총을 들어야 했다.
장애인 선수들은 “장애를 극복했다”는 표현을 불편하게 여긴다. “장애는 평생 갖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는 게 그들의 생각이다. 항저우로 파견된 기자들은 장애인스포츠 취재 경험이 많지 않았다. 기자들은 기사를 쓰는 기준, 전달 정도를 고민했다. 항저우발 기사들에는 “장애를 이겼다”, “장애 속에 기적을 이뤘다”는 표현이 거의 없었다.
장애를 가진 사연를 소개할 때도 최소화했다. 언제, 어떤 식으로 다쳤다는 정도로 ‘대충’ 썼다. 장애인체육회가 선수 정보를 담아 미리 배포한 미디어 북에서도 장애를 가진 사연은 한 줄로 담겼다. 독자 입장에서는 궁금할 법도 하지만 기자들은 짧게, 두루뭉수리하게 전하는 데 초점을 뒀다.
장애인 선수들은 “영웅”이라는 말을 싫어한다. 그들은 평범한 사람, 평범한 선수로 자신들을 봐주기를 바란다. 장애인 선수들은 “같은 장애 등급을 가진 선수들 간 경쟁에서 좋은 성과를 냈을 뿐이다. 나는 영웅이 아니라 열심히 훈련한 선수”라고 말한다. 장애인을 영웅시하는 표현은 장애인을 타자화(他者化)하는 동시에 장애인에 대해 무관심한 비장애인들이 자위하는 말 아닐까.
장애인스포츠를 처음 보면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적잖다. 플레이가 다소 느린 데다, 경기 진행도 약간 더디다. 태생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선수 입장에서는 격렬하고 용감하기 이를 데 없다.
시각장애 축구는 5인제다. 필드 플레이어 4명은 안대를 낀다. 공에서 나는 소리만 믿고 몸을 날리고 머리를 들이댄다. 골키퍼는 비장애인이다. 앞을 못 보는 두려움 속에 시력을 잃지 않은 골키퍼를 뚫고 넣은 골은 엄청난 용기를 실천한 결과물이다.

골볼은 3인제 축구와 비슷하다. 눈을 가린 3명이 9m 크기 골문을 지키면서 공을 굴려 골을 넣는다. 빠르게 굴러오는 둘레 76㎝, 무게 1.2㎏짜리 공을 청력에만 의존해 막는다. 여자 대표팀 김희진은 “공이 언제, 어디에 맞을지 모르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긴다”고 토로했다.
휠체어 레이싱은 순간 시속이 30㎞를 넘는다. 자칫 집중력을 잃으면 선수와 충돌해 크게 다칠 수 있다. 휠체어 레이싱을 30년 동안 한 베테랑 유병훈도 “마치 교통사고와 같다”며 “1년 전 사고 충격이 지금도 가시지 않는다”고 말했다. 휠체어 농구는 휠체어끼리 강하게, 쉼 없이 충돌하기 때문에 큰 부상 가능성이 상존한다. 척수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식구, 자녀가 참가하는 수영을 보면 가족들은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다. 함께 슬로프를 내려오면서 가이드 지시에 따라 기문 옆을 회전하는 시각장애 스키 선수들은 상상하기 힘든 대단한 담력의 소유자들이다.
장애인·비장애인이 공생하는 스포츠
상대에 대한 두려움에 앞서 장애에서 비롯된 많은 위험이 곳곳에, 매 순간 도사리고 있다. 그런 두려움 속에서 공을 향해, 상대를 향해, 결승선을 향해 몸을 던지는 동작은 용감하면서도 숭고하다. 장애인 종목들은 개인주의, 경쟁주의, 이기주의에 매몰된 사회에 많은 질문과 교훈을 던진다.
휠체어 농구는 5명이 뛴다. 선수들은 장애 정도에 따라 1.0, 1.5, 2.0, 2.5, 3.0, 3.5, 4.0, 4.5로 등급이 나뉜다. 숫자가 낮을수록 장애가 심하다는 뜻이다. 비장애인 농구는 아무런 규제 없이 5명을 출전시키면 된다. 반면 휠체어 농구는 선수 5명의 등급 합계가 14를 넘지 않아야 한다. 장애가 덜한 선수와 더한 선수가 함께 섞여야 한다.
골볼 선수들은 공에서 나는 소리에 의존해 몸을 던진다. 플레이가 이어지는 동안 관중은 철저하게 침묵한다. 승부가 결정되는 순간, 함성이 터진다. 장애인과 완벽하게 호흡하는 관중만 관전할 자격이 있는 셈이다. 시각장애 축구에서 골키퍼는 자기 팀이 수비할 때 자기 선수들에게 공과 상대 선수 위치를 말로 알린다. 골대 뒤에 있는 가이드(상대팀 코치)는 자기 선수들에게 골대 위치와 각도, 슈팅 타이밍을 외친다. 관중은 볼이 살아 있는 동안 응원을 자제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가하는 종목도 있다. 2인용 탠덤사이클은 앞에서 비장애인이 핸들을 조정하고 장애인이 뒤에서 페달을 밟는다. 이번 항저우대회에서 3관왕을 합작한 김정빈은 장애인, 윤중헌은 비장애인이다. 시각장애 육상선수 옆에는 가이드 러너가 함께 달린다. 가이드 러너는 선수와 끈을 맞잡고 뛰면서 방향 등을 알린다.
장애인스포츠에는 경기보조원, 생활보조원이 있어야 한다. 이철재는 사격에서 금, 동메달을 땄다. 이철재는 경추 장애인이라 실탄을 대신 장전해주는 로더가 있어야 한다. 로더는 아내다. 시각장애 수영선수가 터치 라인에 가까이 오면 공이 매달린 긴 막대기로 머리를 툭 쳐주는 것, 시각장애인을 경기장 안팎으로 안내하는 것도 경기 보조원이 하는 일이다. 생활보조원은 식사, 목욕, 환복 등을 도와준다. 식구, 특히 엄마, 남편 또는 아내가 주로 한다.
‘장애인스포츠’라는 세상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는 걸 넘어 차별하는 이 사회와 달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대등하게 공생하는 곳이다. 장애에 대한 편견과 섣부른 판단을 버리자. 그리고 장애인스포츠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장애인 선수 입장에서 경기를 바라보며 응원하자. 장애인스포츠는 말한다.
“상대를 이해하면서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게 더불어 사는 사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