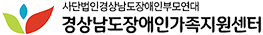187명의 장애인, 우리를 없애지 마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1,973회 작성일 23-11-07 13:34본문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말이 고루하다고 생각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랬다.
기록글을 쓸수록 주변에 직장인 타이틀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 늘었다. 아픈 사람, 장애를 지닌 사람을 반기는 일터가 아니다. 성정체성이 다른 이에게 면접장은 모욕의 장소로 돌변한다. 돌봄과 육아를 전담하는 여성에게 단절과 퇴사는 일상이다. 이들이 들어가지 못하거나 제 발로 나와야 하는 일터를 두고, 저기서 나오면 죽음뿐이라고 말하는 것이 싫었다.
한 기자회견장에서 저 구호를 듣기까진 그랬다. 2023년 10월 고용노동청 앞, 좀 ‘다른’ 이들이 모였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우리가 증거입니다”
“집에만 있다가, 나도 나와서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김성현)
그에게 ‘동료지원가’라는 직업이 생겼다. 중증장애인 당사자가 상담과 자조모임 등을 통해 동료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이끄는 역할이다. “이 일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불운한 소식이 들렸다. 고용노동부가 2024년도 동료지원가(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고 예고했다. 이대로라면 동료지원가 187명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해고는 살인이다!” 누군가 이 구호를 외쳤다. “저희가 실적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정말 5년 동안 열심히 일해왔고요. 보고서도 열심히 썼고, 활동 실적도 열심히 쌓았습니다.”(최다정)
하지만 저 위에서 숫자놀이 하는 사람들에게 이들이 만들어낸 실적은 아무것도 아닐 텐데. 쓸모없는 것일 텐데. 그래, 문제는 ‘쓸모’에 있겠다. ‘해고는 살인’이란 말이 불편하다고 했지만 ‘잘리는 일’의 무서움을 몰라서 한 소리가 아니다. 노동이 나를 거부할 때 오는 절망감을 안다. 당장 생활비도 걱정이지만, 단기 아르바이트만 잘려도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 같다.
우리는 일의 선택을 받아 쓰임새를 얻는다. 반면 일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면 쓸모를 의심당한다. 그러니 아등바등한다. 나 역시 그래왔다. 늘 증명하는 삶이다. 그런데 이날 모인 이들은 다른 증거를 들이밀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증거입니다.”
동료됨조차 실적으로 증명하라는 효율의 세상에서 그 증거를 사람으로 제시한다. 이 세계의 쓸모와 거리가 먼 사람들이 피켓을 흔들며 환호했다.
“동료지원가로 일하기 전에는 친구나 사람을 많이 만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에선 비슷한 사람들과 지내고, 늘 정해진 시간에만 움직여야 했습니다. 일하며 사람들과 밥 먹고 같이 이야기하는 걸 좋아함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시력이 안 좋아도 다른 것을 잘하는 사람임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쓸모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문석영)
“같이 있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어떤 쓸모냐.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것이 그의 대답이다. 다른 두 세계가 맞부딪치는 것을 본다.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우리가 시시하다고, 없애지 마라!”(이승준) 이 세계의 눈금을 들이댄다면 이들의 효율은 시시하다. 그런데 어쩐지 없애지 말라는 것이 187명의 일자리가 아니라, 그들 자신으로 들린다. ‘우리를 없애지 마라.’
사회가 정해놓은 쓰임에 맞지 않는 사람은 지워진다. 그 틀에 자신을 맞춰 ‘건강한 노동자’이자 ‘가장’의 삶을 살다가 하루아침에 쓸모를 다했다는 선언을 들은 이들이 있다. 쓸모없는 몸이라며 유폐됐다가 ‘함께’의 쓸모를 찾아 세상에 나왔지만 ‘쓸데없이’ 돈이 든다며 사라질 것을 요구받는 이들이 있다. 그래, 존재를 지우는 것은 살인이겠다.
희정 기록노동자·<베테랑의 몸>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