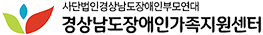집에만 갇혀 지내던 아들 "생매장이랑 뭐가 달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장가센터 조회 6,321회 작성일 20-11-20 18:12본문
최중증발달장애인 동훈씨의 죽음, 가족에만 맡겨진 돌봄
[은평시민신문 박은미]
집안에 갇혀 지내는 현실, 생매장 당한 기분과 같아

특히 올 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그나마 운영되던 여러 시설들이 갑자기 문을 닫게 되면서 시설에 의존했던 많은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은 커졌다. 그 중에서도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겪는 고통의 무게는 상상을 초월했다. 갑자기 갈 곳을 잃은 최중증발달장애인이 겪는 고통도 컸지만 하루 종일 잠시라도 이들에게서 눈을 뗄 수 없는 가족들이 감당해야 할 돌봄 노동의 무게는 너무 컸다.
가족 돌봄에만 맡겨진 현실, 결국 예상치 못한 이별로
지난 8월 18일 세상을 떠난 최중증발달장애인 동훈(가명, 30대, 서울 은평구)씨도 예외는 아니었다. 올 초부터 유행한 코로나19로 주간보호센터는 문을 열고 닫기를 반복했다. 갑자기 갈 곳을 잃은 최중증발달장애인은 집 밖을 벗어나기 어려웠고 이들을 돌보는 일은 가족들의 몫이 됐다.
동훈씨는 어머니 이정숙(가명, 60대)씨와 단 둘이 살고 있었다. 일찍이 동훈씨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동훈씨를 돌보는 일은 어머니 혼자 감당해내야 했다. 하지만 서른이 넘은 건장한 청년인 동훈씨를 나이 60이 훌쩍 넘은 어머니 혼자 돌보는 일은 애초부터 무리였다.
평소 어머니는 동훈씨에게 조금이라도 위험하다 싶은 물건들은 모두 한 방에 집어넣고 문을 잠궜다. 샴푸 하나, 로션 하나를 마음대로 둘 수 없었고 거울 하나를 벽에 걸어둘 수 없었다. 동훈씨가 복용해야 할 여러 종류의 약도 따로 보관되어 있었다. 어머니는 항상 허리춤에 각종 열쇠꾸러미를 차고 다니면서 동훈씨를 보호했다.
동훈씨는 스무 살이 넘어 간질을 앓기 시작했다. 다행히 빨리 약을 먹기 시작해서 큰 위험은 넘겼지만 언제라도 다시 간질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약은 평생 먹어야 한다고 했다. 아침에 3알, 저녁에 3알 그리고 보조약을 아침에 2알, 저녁에 2알씩 먹었다. 소근육이 발달하지 않은 동훈씨는 손으로 하는 정교한 작업은 어려워서 지퍼백처럼 밀봉되어 있는 약봉지를 혼자서는 잘 열지 못했다.
사고가 있던 날도 동훈씨는 어머니와 함께 집에 머무르고 있었다. 하루 24시간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돌봄으로 이미 어머니는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태였다. 밥을 챙겨 먹는 것부터 일상생활의 하나하나가 모두 전쟁이었기 때문이다.
간질 약이 없어진 걸 알았을 때 어머니는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하필 방문을 잠그는 걸 깜빡했는데 그 새 일이 벌어졌다. 동훈씨가 간질 약을 털어넣은 것이다. 예전에도 동훈씨가 수면제를 과다복용한 일이 있어 그 때처럼 다시 일어날 거라 믿었다. 하지만 동훈씨의 숨이 거칠어지고 119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뒤였다.
인터뷰 내내 어머니는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었다. "하늘에서 귀한 생명을 내게 맡겼는데 제대로 돌보지 못해 하늘에서 다시 데려간 거 같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사회복지를 전공한 것도 관련분야에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어머니는 동훈씨를 돌보며 자나 깨나 '장애' 관련 고민만 하며 지냈다. 그렇게 30년이 넘는 시간을 아등바등 동훈씨를 위해 살았는데 예상치 못한 이별 앞에 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최중증발달장애인, 단 하루라도 마음 편히 맡길 곳 필요
지난해 1월 어머니는 동훈씨를 강원도에 있는 폐쇄병동에 맡겼다. 나중에 아이를 돌볼 수 없게 되면 거주시설에라도 보내야 하는데 입소하려면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훈씨는 폐쇄병동에 간 지 5일 만에 쫓겨왔다. 이렇게 힘든 장애인은 돌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그렇지만 어머니는 포기할 수 없었다.
올해 5월 다시 강화도에 있는 폐쇄병동에 맡겼다. 이번에는 9일 만에 쫓겨왔다. 온 몸이 엉망이 되어 돌아왔다.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 놓아 멍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 시설에 보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지방에 거주시설을 마련하려고 나섰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머니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보호센터에 갈 수 있으면 다행이고 아니면 집에서 돌보는 것이 전부였다. 진즉에 국가와 사회가 나눴어야 할 장애인 돌봄을 개인에게만 떠넘긴 결과가 동훈씨의 죽음으로 이어졌다.
코로나19 확산방지 목적으로 장애인 이용시설이 문을 닫는 일이 많아지면서 개인이 감당해야 할 돌봄 노동의 무게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졌지만 이를 나눠 짊어질 곳은 부족했다.
동훈씨 어머니와 함께 인터뷰에 참여한 김미정(가명)씨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 역시 중증발달장애인 자녀를 두고 있다. 김미정씨는 "집안에서 꼼짝을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며 이게 생매장이랑 뭐가 다른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 국가에서 함께 돌봄을 해야 하나 않나? 단 하루만이라도 아이를 맡길 곳을 찾았지만 환경이 열악해서 해줄게 없다는 답변만 반복적으로 들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동훈이가 그렇게 가는 걸 보고 나니 사는 게 너무 허무하다. 구청이고 어디고 다니면서 이런 거 저런 거 얘기하고 요구하는 것도 하지 말고 이렇게 그냥 살다 가지 뭐. 사회의 짐덩이 된 느낌도 싫고 힘이 든다"고 말했다.
동훈씨 어머니는 "성한 사람의 생명만 천하보다 귀한 게 아니고 우리 아들의 생명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었다. 발달장애인 자식도 하나님과 부모한테는 천하의 그 무엇보다 귀중한 생명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생을 밤낮없이 아이와 함께 했다. 아이가 나에게 왔다간 이유는 무엇인지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